누나의 책 꽂이에서 찾은 책. 보리 출판사의 누런 종이를 보니 녹색 평론이 생각난다. 역시 책의 내용도 비슷한 채취를 풍긴다. 충분히 교육 받은 사람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귀향에 땅을 경작하고 필요한 물건을 손수 만들면서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이야기 이다. 누나가 이런 책만 읽으니까 그렇게 녹색으로 변한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다.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세상과 자연에 대한 남다른 의미부여에도 동의하지만 완전히 동의할 수도 없고, 곧이 곧대로 그 들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받아 드릴 수는 없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시골에서의 식사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단촐한 식사, 제한된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를 두고 기름지지도 풍족하지도 않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이며, 충분한 영양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것 조차 어느 순간에 전체를 돌아보며 느끼는 대략적인 느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우리가 유년시절의 일부를 회상하며 한 두 문장으로 즐거웠던 점심시간을 소개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표현을 하는 시점의 감정까지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굳이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듯이 접근하는 이유는, 이런 경험담 한 두개를 가지고 환상을 갖아서도 안되고, 그 경험담이 사회의 통념이나 일련의 문제에 대한 어떤 주장의 근거로 사용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경험을 충분히 존중하고, 귀한 자료로 받아드리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례로 여겨지는 것이 옳다.
나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작가들도 동일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미 자신들의 삶이나 결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의 경험한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좋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작가들은 모두가 도시를 떠나야 한다거나 도시는 농촌 생활을 옳고 도시는 그르다는 말을 남기지 않았다.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경험담임을 말하길 원했다.
이 끊임없는 물음에 대답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 머나먼 버몬트 산골짝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일어나는 노사 분쟁을 보지 않아도 되며, 대도시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여행하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받게 마련인 압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버몬트의 생활은 대도시의 생활과 본질부터 다르다.
더럽고 시끄러운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을 보내는 대신, 주중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딸에 있었다. 우리에게 출퇴근이란 부엌에서 제당소로 2백 걸음쯤 걸어가는 것을 뜻한다.
여담으로, 이 분들의 버몬트 생활은 1932년부터 1952년까지였다.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 전쟁 기간중인데, 지하철 타고 출퇴근에, 노사 분규라니 매칭이 안된다.ㅎㅎㅎ
마지막으로 이책이 나에게 던지고 싶은,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세지가 적나라게 표현된 부분을 옮겨 놓으며 독후감을 마치려 한다. 어떤 주식을 살지. 어느 아파트가 더 오를지에 대한 고민을 잠시 접어두고,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마크 트웨인의 말마따나, "문명이란 사실 불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끝없이 늘려 가는 것이다." 시장 경제는 떠들썩한 선전으로 소비자를 꼬드겨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물거을 사도록 만든다. 그리고 돈을 내고 그런것들을 사기 위해 자기의 노동력을 팔도록 강요한다. 노동력을 팔 때 생기는 착취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명한 쥐가 덫을 조심하는 것처럼 시장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독자들은 이렇게 빈틈없는 생할 태도를, 고통스러울 만큼 욕구를 억누르고 절제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 원해서 엄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런 느낌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지나치게 전시해 놓고, 음식과 기계에서부터 시간과 에너리제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낭비하는 뉴욕시에서 살다 온 우리는 그 많은 도시의 잡동사니 쓰레기들을 한꺼번ㄴ에 내던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기뻤다.
'감상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독후감]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0) | 2020.09.17 |
|---|---|
| [독후감] 유병재 농담집 블랙코미디 (0) | 2020.09.09 |
| [독후감]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0) | 2020.08.24 |
| [독후감] 90년생이 온다 - 간단함, 병맛, 솔직함 (0) | 2020.05.20 |
| [독후감] 교실 속 자존감 - 함께 행복하자! (0) | 2020.03.28 |
| [독후감] 숨결이 바람 될 때 (2) | 2020.03.09 |
| [독후감] 2020 부의 지각변동 - 경제 공부를 통해 줏대를 갖자 (0) | 2019.12.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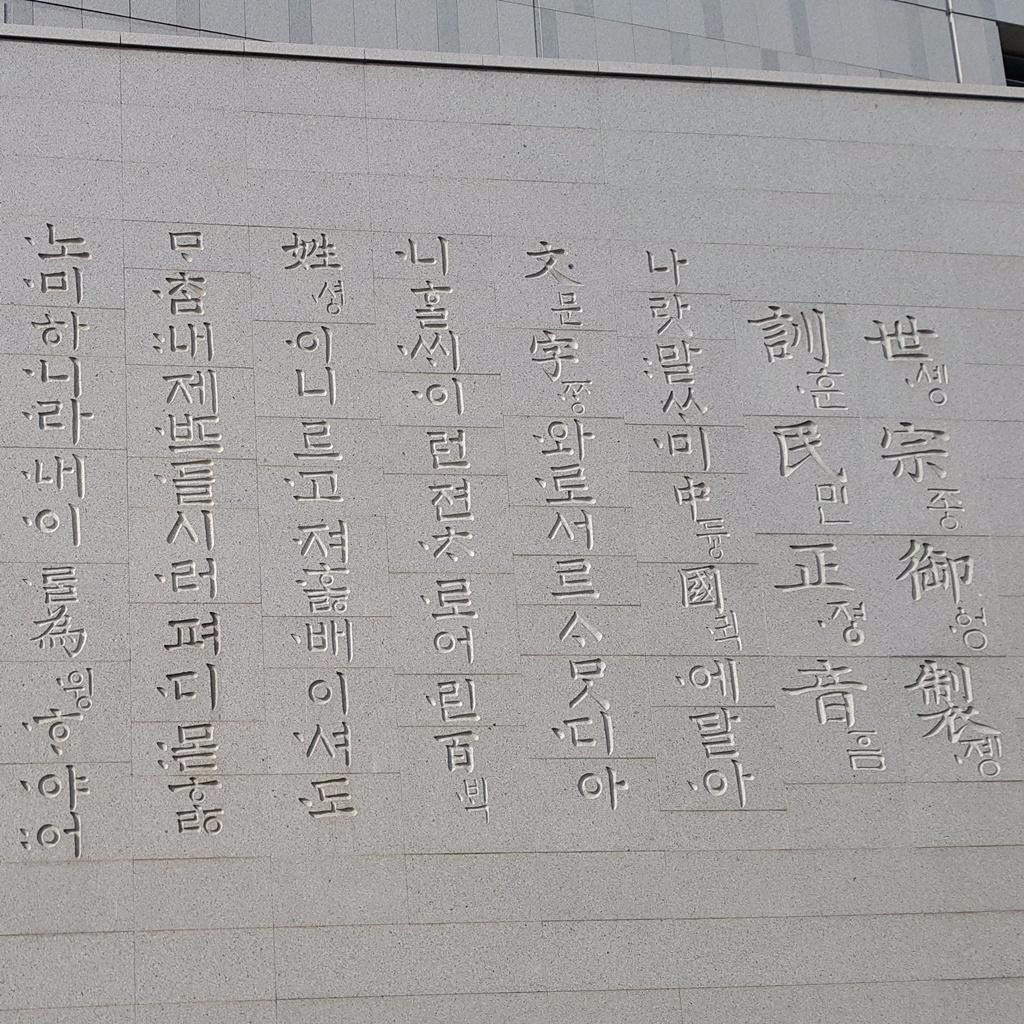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