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하 작가가 말하는 여행의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책을 보다보니 김영하 작가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게되었다. 공교롭게도 첫번째 글에서 여행을 통해 알게되는 '뜻밖의 사실'의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쩌면 내가 CRA 교육에 들어가게 되고, 쉬는 시간에 휴게실의 많은 책 중 이 책을 골라서 김영하 작가를 더 잘 알게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미쳐 몰랐던 내 모습과 내 생각을 발견하게 된 것도 여행에서의 알게된 '뜻밖의 사실'과 같은 것일 지도 모르겠다. 일상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뜻밖의 사실'의 발견을 기대한다. 나는 그 사실의 크기나 무게와는 별개로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것을 알기에 힘들게 돌아오자 마자 다음 여행을 꿈꾼다.

한 번은 제대로 빡시게 캠핑을 다녀왔더니 집에 소파가 그렇게 폭신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원채 가만히 있질 않는 성격이라 소파에 편히 오래 앉지도 않는 편인데, 앉아도 끝에 엉덩이만 걸쳐 앉거나 등을 기대지 않고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책을 보거나 할 뿐, 그 날은 축쳐져서 소파에 온 몸을 맡겼더니 소파는 나의 전신을 포근히 안아주었다. 타고난 집순이 아내가 "어때? 이제 힘들어서 못다니겠지?"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안했지만 머릿속에는 다음 캠핑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캠핑은 여행 중에서도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여행이라서, 가는 곳마다, 계절마다, 날씨마다 챙겨간 연장과 요리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하루 종일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속에서 사는 나에게 여행은 오감을 자극하는 반찬이나 요리와 같다. 춥고 배고플 틈 없이 밥을 잘 챙겨 먹지만 배만 부르다고 행복할 수 없기에 주말마다 반찬을 찾아서, 요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다.
겸손하게 당당하게 나를 보는 노바디의 여행
김영하 작가가 무명일때와 해외 22개국에 번역본을 출간하고 나름 유명해진 후 여행을 할 때, 사뭇 다른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어차피 여행객은 노바디일 뿐임에도 우리는 때론 섬바디이길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여러모로 많이 해 보았다. 익숙치 않은 어딘가에서 완전히 나를 모르는 누군가를 만날때,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을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생각을 많이 해본다. 그 순간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나름의 재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때 나는 나 자신을 겸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바라본다. 겸손함을 갖는 이유는 나는 입문자이며, 처음 만난 사람, 초보자 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니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시작될 것이기에, 의도적으로라도 갖게되는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겸손한 마음이 의도적으로라도 준비된 것과는 반대로 원치 않아도 생기는 것이 불안감과 수줍음이다. 이 불안감과 수줍음을 통제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나 스스로를 당당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마음 가짐을 위해서는 지나온 나의 삶을 돌이켜 스스로 칭찬과 격려를 마구 쏟아내야 한다. 객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성취를 떠올려 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살아온 한 인간으로서 존재 자체를 당당하게 인정하려고 노력한다. 이때 겉보기에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감정은 나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파리 에펠탑 아래 센 강변에서,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프라하의 작은 펍에서 외국인들에 둘러 싸여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속으로 부지런히 주문을 외웠던 나를 보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일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나 스스로의 존재는 여행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낯선 타인이 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여행지의 물리적 거리나 시간과 무관하게 낯서 장소에서 느낄 수 있기도 하지만, 그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서울의 낯선 동네 서점을 방문하는 것과 지방의 서점 그리고 프랑스의 서점은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들리는 소리와 분위기도 아주 많이 다르다. 나는 타인으로서 나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지도 모르겠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듯 나와 내 삶을 한 발치 떨어져서 보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 미술관에서처럼 그냥 잠시 여유를 갖아보려고 여행을 가려나 보다.
모든 것을 볼 수도, 할 수도 없음을
김영하 작가를 알게된 것은 알아두면 쓸떼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였던 것 같다. 보지 않았지만 여행편으로도 확장될 만큼 꽤나 알려졌다. 유명한 프로그램이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책에서는 여행 편에 대한 뒷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행지를 결코 모두 잘 알고 소개할 수도 없고, 모두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타인을 통해서 접하는 여행은 또 다른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에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에 살아도 서울을 모두 잘 알 수 없고, 거기까지 가서 보고 느낀 것은 결국 모두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각자의 삶은 시간과 공간의 축 어느 한 점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드린다면 말이다.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여행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함이라는 글귀를 소개해줬다. 그래서 호텔을 좋아 한다고 한다. 그곳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새로운 물건들로 따뜻하게 우리를 반겨주기 때문에 고통을 잊을 수 있다고 한다. 새 물건 보다는 쓰던 물건에 정이 가고, 상처난 물건도 쉽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호텔을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새디스트라서 상처를 쿡쿡 찔러보고 들춰보나 보다.
호텔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냐만은 이전 사람의 어떤 흔적도 쉽게 찾을 수 없고, 깔끔하게 정리 정돈 되어 있는 공간은 왠지 모르게 삭막하다. 내가 머문자리도 그렇게 아무런 흔적도 없이 정리된다는 생각은 마치 내가 왔다갔던 추억도 모두 사라지고, 그 시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유는 모르겠다만 그냥 그런 기분이 든다. 그렇다고해서 내 흔적을 간직하고, 내가 왔던 기록도 모두 간직한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것도 없을 것 같지만 말이다.
'감상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독후감] 배민스토리 - 2023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보고서 (0) | 2023.10.03 |
|---|---|
| [독후감] 빌 캠벨 실리콘밸리의 위대한 코치 - 1조 달러 코치 (0) | 2023.09.10 |
| [독후감]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 How to Be Perfect (0) | 2023.09.03 |
| [독후감]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0) | 2023.06.30 |
| [독후감] 딜리버링 해피니스 (0) | 2023.06.06 |
| [독후감]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0) | 2023.05.29 |
| [독후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0) | 2023.05.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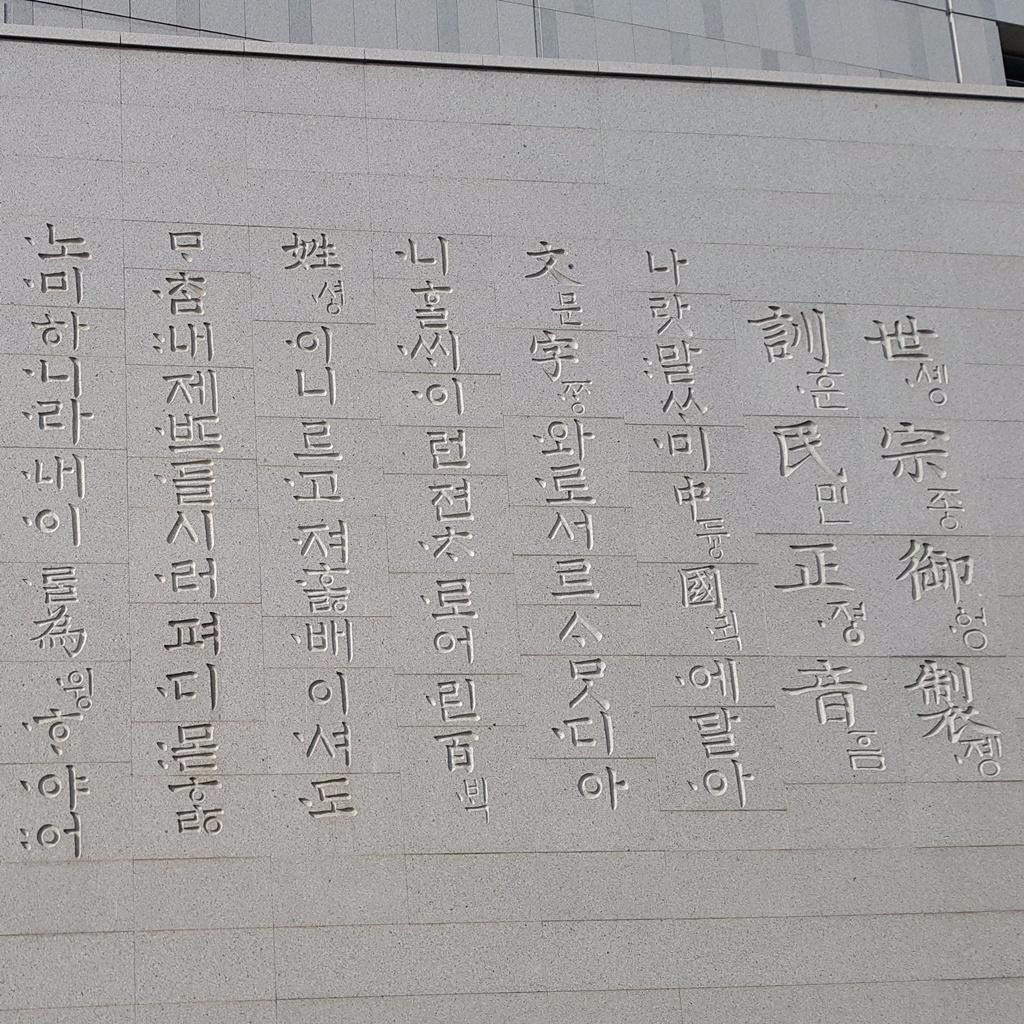
댓글